바다가 토미한테 오지 않으니 토미가 바다로 가는 거로군, 어떻습니까
- 작성일 2020-01-01
- 좋아요 0
- 댓글수 0
- 조회수 1,644
[신작시]
바다가 토미한테 오지 않으니
토미가 바다로 가는 거로군, 어떻습니까? *
김륭
어머니, 누워서 밀고 있다. 요양병원 침상에 누워서 자꾸
아버지를 밀고 있다. 이젠 나도 좀 누워 봐요. 죽기 전에
다리라도 좀 편히 뻗어 봐요. 물갈퀴가 비치기 시작한 어머니 발에 채여 둥둥 떠내려가는 아버지,
아버지 무덤을 나는 모르는 척 눈감아 주는 것인데, 밤새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누워 밑줄 그었던 문장을 따라가다 문득 막다른 골목 시멘트벽에 그려 놓은 바다를 떠올린 것인데, 요양보호사가 말했다.
식사 시간이에요. 침대 좀 세워 주시겠어요? 나는 토미가 아닌데
나는 어머니 발밑에서 으르렁거리는 바다를 잡아와 미역국 끓이고 조기라도 한 마리 굽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정말 토미가 아닌데, 떠내려가는 아버지를 잡아와 어머니 곁에 가만히 눕히고 싶었을 뿐인데, 요양보호사가 또 말했다.
이봐요, 침대를 좀 더 세워 주시겠어요.
* 안토니오 타부기, 『인도 야상곡』에서
부고
눈싸움하는 아이들을 보고 눈사람이 말했다
곧 봄이 올 것이다, 눈사람은 햇빛 어른거리는 길 위의 코끼리처럼 *
우아하게 내가 가장 추웠거나 뜨거웠던 날의 기억들을
가만히 식탁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꽃들이 국밥 먹으러 오길
기다릴 것이다
* 우밍이, 소설 제목 「햇빛 어른거리는 길 위의 코끼리처럼」에서 차용
|
||||
《문장웹진 2020년 1월호》
추천 콘텐츠
세차장과 폐차장 신이인 새 것이 필요했는지도 모르지 어둠 속에 앉아서 내가 왜 지루했는지 심해 생물처럼 덤덤했는지 도대체 뭘 더 알고자 했는지에 대해 천착하는 일은 멀쩡한 접시를 벽에 던져 부쉈을 때의 희열과 낭패 찌릿한 안타까움 그 행동이 실은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는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나는 이보다 더한 것을 깨닫게 될까 두려워 차 안에서 나오지 않기를 결심했다 엔진이 낡은 자동차 더는 옛날처럼 성내지 않는 자동차 크게 사고 난 적 없어 아직 내 것이나 겨우 이런 것이 내 것이라니 고속도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거나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차에 갖다 박아버리고 싶기도 했던 엔진이 낡은 자동차 하나 너는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 으레 연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애들이 그렇듯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고 인생에 단 한 병뿐인 샴페인을 따서 나누었네 한 번뿐인 폭발 그리고 술에 젖은 채,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맛이라 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리워했다 참 훌륭했는데 무엇이 훌륭하고 형편없는지, 모르는 첫 삶이었으면서 아무래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 페인트 붓이 차창 밖에서 손짓하도록 이봐, 이름이 뭐야 난 시간이라는 미장이라네 여기부터는 내 구역이다 저것의 숱한 촉수들이 우리를 한 번 쓰다듬고 나면 어떤 색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였다 차창이 검게 틀어 막힌 이래로 네가 어디쯤에서 어떤 날씨를 가로지르나 얼마나 잔잔하게 또는 뜨겁게 구르거나 일어서는가 행복할 때 그 기분을 처음 가져 본 것처럼 기뻐하는가 궁금해하지 않았던 적 없다
- 관리자
- 2024-08-01
방주 신이인 그때는 고분고분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바닷물과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뛰어 들어갔다. 듣던 것과는 다른 진한 황토색 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물이 황토색이네요? 내가 말한들 귀담아듣는 이 없었다. 먼 과거에 스스로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으나 소용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배운 이들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파도를 탔다. 처음 나는 물을 몇 번 먹어야만 했다. 그들이 모래 바닥에서 발을 구르며 뛰어오를 때 같이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더 뛰어도 덜 뛰어도 안 된다. 빨리 뛰어도 늦게 뛰어도 안 된다. 뛰는 법이 몸에 익은 다음부터 어쩌면 고통만큼은 사라진 듯했으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또 묻고야 말았다. 바닥이 발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러나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북스럽게 바라봤다. 우리는 수영을 하러 온 거야. 앞을 봐. 저 멀리서. 수평으로 헤엄치고 있는 선각자들을 봐. 저렇게 멋지게 나아가고 싶지 않니? 빛을 내는 수평선과 하나 된 듯이. 멀리 있는 물은 푸른색 같아 보이기도 했다. 저들은 저기 가 닿을 거야. 이미 닿았을 거야. 중얼거리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우글우글 있었다. 끝없이 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교인들이었다. 그쯤에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들이 배로 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배를 만들고 부모와 친구 좋아하는 개 고양이까지 싹 태워 출항시켰다. 그들이 찾는 것은 전부 바다에 있다. 나는 바다에 없다. 나는 느끼고 싶다. 발에 단단하게 닿는 흑색 바닥. 바닥이라면 내 무게를 질 수 있다. 언제까지나. 배에 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며 여전히 사랑한다. 이토록 육중하게 나 여기에 있다. 있다. 여기에.
- 관리자
- 2024-08-01
어쩔 줄 모르고 최문자
- 관리자
- 2024-08-01
저번까지 읽은 이후로 이어보시겠어요?
선택하신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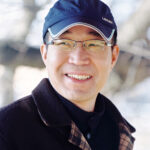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