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일, 『바오밥나무와 달팽이』를 배달하며
- 작성일 2023-09-14
- 좋아요 0
- 댓글수 0
- 조회수 1,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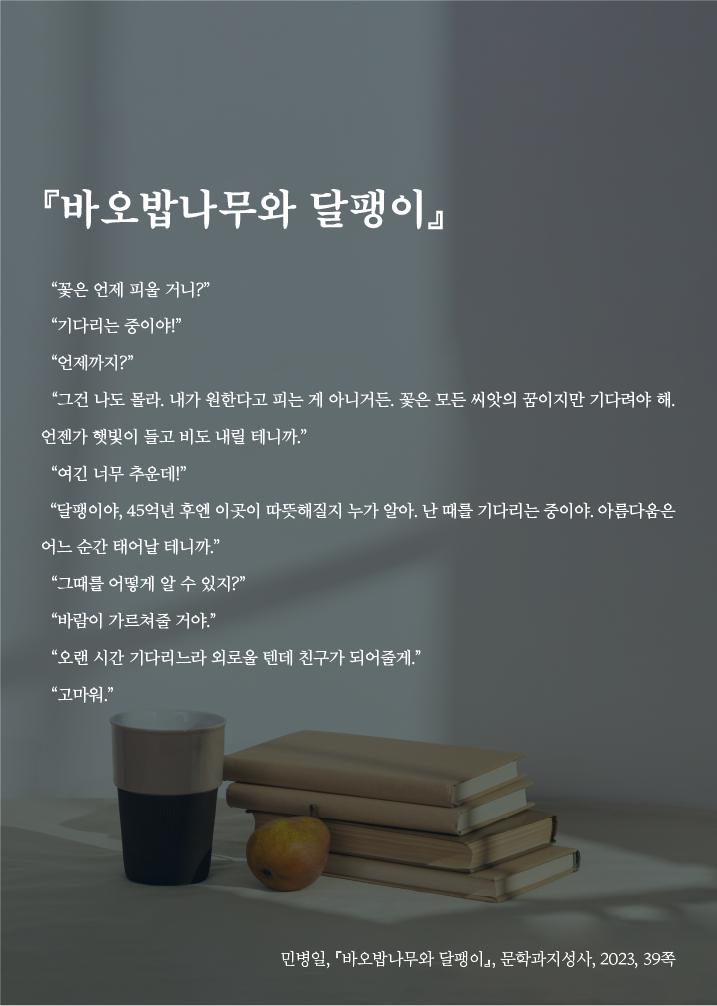
꽃을 피우기 위해 45억 년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은 말한다. 원한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고. 꽃이 피는 걸 보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원하는 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이가 본다고 한다. 꽃은 모든 씨앗들의 꿈, 그러나 꿈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꿈이 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 갑자기 꽃이 피어난다고 한다. 어느 순간 갑자기 태어나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 없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지금 여기 있는 누구나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기를 바라는 누구나 무엇을 기다린다. 지금 여기 있기를 바라지 않는 누구나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 그, 혹은 그것이 여기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혹은 그것이 여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린다. 바라는 마음 없이 기다릴 수 없다. 바라지 않는 사람이 기다릴 수 없는 것처럼 바라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을 수도 없다.
기다림은 45억 년을 순간으로 만든다. 어떤 천 년은 하루 같고 어떤 하루는 천 년 같다. 아니, 기다림은 시간에 속하지 않는다.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난 때를 기다리는 중이야, 라고 씨앗은 말한다. 아름다움이 문득 태어나는 어느 순간이 그 ‘때’다. 때는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특별한 사건(카이로스)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45억 년을 기다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추천 콘텐츠
봄을 세 번 나는 동안 벌통들에서 차례로 벌들이 부활했다. 벌들로 들끓는 벌통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은 아버지가 되살아난 것만 같은 흥분에 몸을 떨었다. 아카시아꽃이 지고 온갖 여름 꽃들이 피어날 때, 마씨와 나는 벌통과 함께 산에 들었다. 마씨는 벌들이 날아가지 못하게 벌통을 흰 모기장으로 감싸고 지게에 져 날랐다. 마씨의 뒤를 따르는 내 손에는 해숙이 싸준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날따라 너무 깊이 드는 것 같아 주저하는 내게 그가 재촉했다. “꽃밭을 찾아가는 거야. 조금 더 가면 꽃밭이 있지.” 정말로 조금 더 가자 꽃이 지천이었다. 토끼풀, 개망초꽃, 어성초꽃, 싸리나무꽃··· 홍자색 꽃이 흐드러지게 핀 싸리 나무 아래에 그는 벌통을 부렸다. 벌통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마씨와 내가 알몸으로 나뒹구는 동안 벌들은 꿀을 따 날랐다. 고슴도치 같은 그의 머리 위로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나는 꿈을 꾸듯 바라보았다. “당신 아내가 그러데, 나비를 기르면 좋을 거라고. 나는 나비가 벌보다 무서워. 우리 할머니가 나비 때문에 눈이 멀었거든. 도라지밭을 날아다니던 흰나비의 날개에서 떨어진 인분이 눈에 들어가서···” “해숙은 착한 여자야.” “착한 여자는 세상에 저 벌들만큼 널렸어!” “널렸지만 착한 여자와 사는 남자는 드물지.” 여름내 마씨와 내가 벌통을 들고 산속을 헤매는 동안 해숙은 아들과 집을 보았다. 우리가 돌아오면 그녀는 서둘러 저녁 밥상을 차려내왔다. 먹성이 좋은 마씨를 위해 그녀는 돼지고기와 김치를 잔뜩 넣고 찌개를 끓였다. 그녀에게 나는 산속에 꽃밭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벌과 나비가 어울려 날아다니는 꽃밭이. “우리도 데려가면 안 돼?” 그녀는 꽃밭을 보고 싶어 했다. “꽃밭까지 가는 길이 험해서 안 돼. 가는 길에 무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무덤들 중에는 내 아버지 무덤도 있지.” “근데 읍내 정육점 여자가 내게 묻더라.” “뭘?” “사내 하나에 계집 둘이 어떻게 붙어사느냐고.” “미친년!” “정말 미친년이야. 내가 살코기하고 비계하고 반반씩 섞어 달라고 했는데, 순 비계로만 줬 지 뭐야.” 눈치챘던 걸까. 아니면 벌과 나비가 어울려 날아다니는 꽃밭을 보고 싶었던 걸까. 그날도 마씨와 나는 벌통과 함께 산에 들었다. 해숙이 우리를 몰래 뒤따르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해숙은 산벚나무 뒤에 숨어 마씨와 내가 토끼풀밭 위에서 알몸으로 나뒹구는 것을 지켜보았다. 날이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부엌 도마 위에는 해숙이 정육점에서 끊어온 돼지고기가
- 관리자
- 2024-06-27
- 관리자
- 2023-12-21
- 관리자
- 2023-12-07
저번까지 읽은 이후로 이어보시겠어요?
선택하신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댓글0건